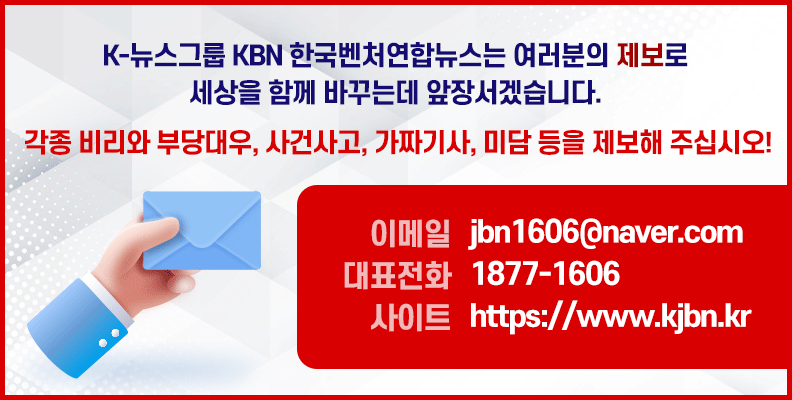패권국의 오만은 어떻게 제국을 무너뜨리는가
― 트럼프 시대, 로마의 마지막을 떠올리다 ―
이 상 수 / 칼럼니스트
요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세계 시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하다. 갈등은 늘었고, 언어는 거칠어졌으며, 국제 질서는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세계 최강국 미국이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시기의 외교와 통상 정책을 떠올리면, 많은 이들이 고대 로마 제국의 패망 직전 상황을 연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로마는 외적의 침입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나라가 아니다. 군사력은 여전히 강했고 영토도 넓었다. 그러나 제국 말기의 로마는 자신이 왜 존중받아 왔는지를 잊었다. 힘은 남아 있었지만 절제가 사라졌고, 규칙을 만들던 국가는 규칙을 무시하는 존재가 되었다. 제국의 몰락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오만에서 시작되었다.
트럼프식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결정의 단순화다. 국가는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으며, 손익 계산은 분명할수록 좋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조차도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기업의 리더가 고려해야 할 변수보다, 국가지도자가 고려해야 할 변수는 수십 배 많다. 경제는 외교와 연결되어 있고, 외교는 안보와 얽혀 있으며, 안보는 역사와 가치, 그리고 동맹의 신뢰 위에 서 있다.
문제는 단순한 해법이 언제나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관세 인상으로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힘으로 동맹을 압박하면 복종이 뒤따를 것이라는 계산은 복잡한 세계 질서를 지나치게 축소한 접근이다.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 성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 신뢰를 빠르게 소진시킨다. 로마 역시 세금 인상과 강압 통치로 당장의 재정을 메웠으나, 그 대가는 동맹의 이탈과 내부 붕괴였다.
강대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립이다. 로마는 제국 말기에 이르러 주변 국가들을 동맹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로마는 혼자가 되었고 혼자 싸우다 지쳤다.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영향력 역시 군사력 그 자체보다 ‘미국과 함께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동맹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순간, 패권은 이미 청구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언어의 변화다. 로마 말기의 통치 언어는 점점 거칠어졌고, 타자의 불만은 약자의 투정으로 치부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발언이 불안과 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 역시 같은 맥락이다. 패권은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두려움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존중을 잃은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패권국의 마지막 책임은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의 피로를 줄이는 역할이다. 그러나 사욕을 감춘 채 ‘자국 우선’을 외치며 힘으로 밀어붙일 때, 세계는 조용히 등을 돌린다. 로마도 “로마를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세계를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세계는 로마 없는 질서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에게, 더 넓게는 모든 강대국 지도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우리는 두려운 나라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함께하고 싶은 나라로 남아 있는가. 역사에서 제국은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존중받을 이유를 스스로 지워버렸을 때 무너졌다. 로마의 마지막이 오늘을 비추는 거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