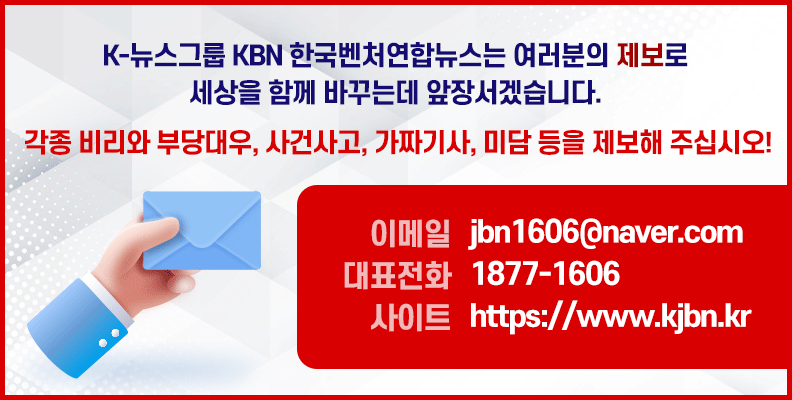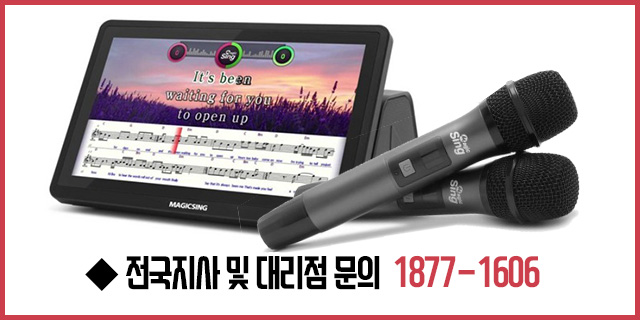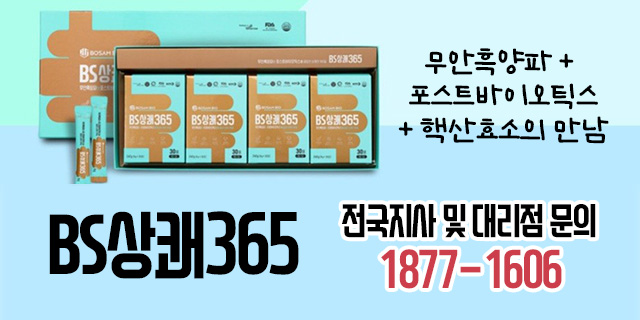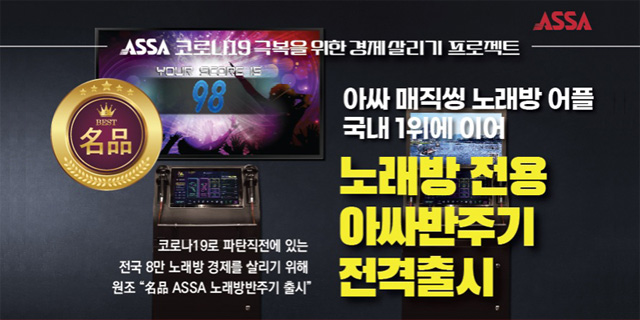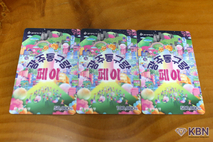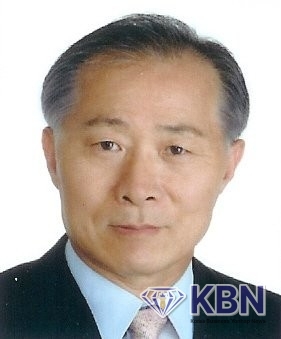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리·경영 기법을 배우며 성장해 왔다.
민주주의 제도와 합리적 경영 방식은 오랫동안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해온 모델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오히려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치 행태가 있다.
트럼프 집권기에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기행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언행에 맞장구치며 박수만 치는 참모들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비판의 부재는 합리적 정책 결정을 가로막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일반인들은 흔히 기업을 잘 경영한 사람이라면 국가도 잘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R. Krugman) 교수는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A Country Is Not a Company, 2009)』라는 저술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는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해도 그것은 국가 경제 전체에 비하면 극히 작은 규모의 일부일 뿐이며, 국가는 기업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기업 경영에서의 경험과 방식을 국가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했다. 그 결과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제가 불거졌고, 이는 미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지도자의 언행과 국가 신뢰도는 국가 운명을 죄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지도자의 언행은 곧 국가의 품격과 신뢰로 이어진다. 즉흥적·선동적 발언은 단기적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나 조직에서도 지도자의 언행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 자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국가 경영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약화되면 참모·관료가 지도자에게 맹종하는 분위기가 생긴다. 그 결과 정책은 합리성을 잃고, 비판 없는 집단 사고(groupthink)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도자를 둘러싼 참모진과 제도적 장치는 ‘비판적 의견’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포퓰리즘(populism)에 치우치다 보면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대중의 불만을 즉흥적으로 달래는 포퓰리즘은 단기적 지지율은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훼손한다. 따라서 정책은 언제나 단기 인기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넷째, 세계 각국의 지도자는 그 태도와 리더십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세계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해 왔지만 자국만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강화되자 국제사회는 불안정해졌다. 이는 작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도자가 전체를 포용하지 않고 자기 이해만 앞세우면 갈등이 커지고 공동체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개인적 품격에 따라 집단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 지도자의 인격적 한계와 독단적 태도는 집단의 성과보다 더 크게 조직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지도자의 개인적 매력이나 언변에 현혹되기보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품격·도덕성·협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는 ‘기업가적 성공’이 곧 ‘국가 운영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대중적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준다.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 것처럼 “기업은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다”라고 인식해야 한다.
트럼프식 정치가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것도 이 같은 본질 차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도자 개인의 한계가 국가와 공동체의 운명을 뒤흔들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비판적 문화,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트럼프 사례가 남긴 가장 큰 반면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