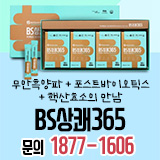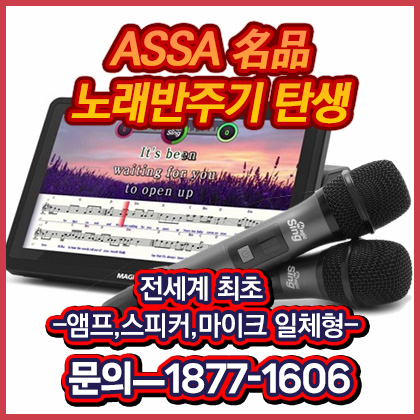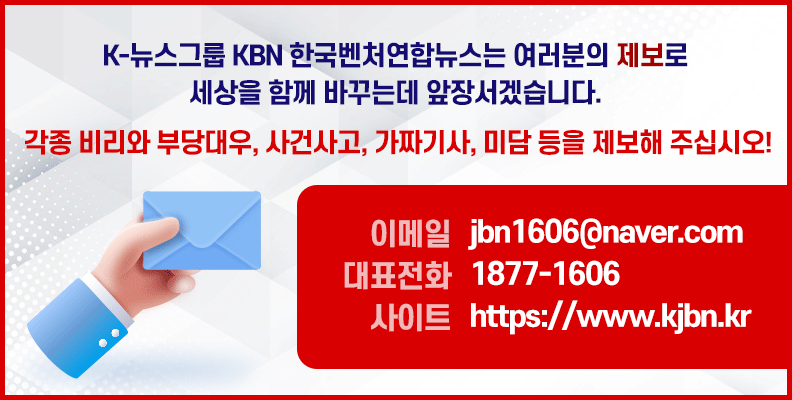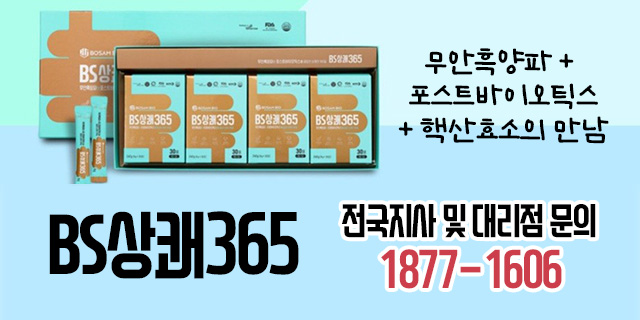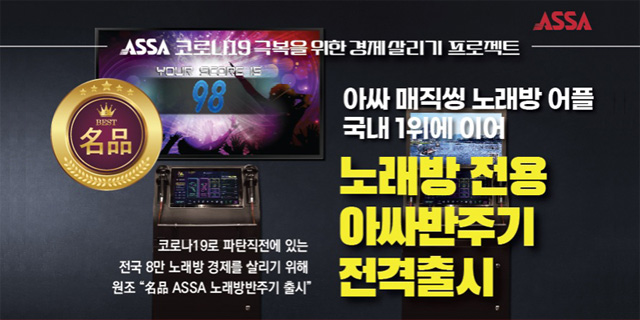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ㅣ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의 조건
– 공정의 심리학 -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옳은지보다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느낀다. 심리학에서도 결과의 유불리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만족감을 결정한다고 본다. “법정에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판결이 불리해도 수용한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절차적 정의’에 있다.

◆ 사람들은 결과보다 대우에 반응한다
심리학자 톰 타일러(T. Tyler)는 공정성 인식의 네 요소를 제시한다. ① 발언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가, ② 존중: 재판부가 인간적 존중을 보여주었는가, ③ 중립성: 판사가 편향되지 않았는가, ④ 신뢰: 재판부가 선의를 갖고 판단한다고 느껴졌는가 등이다. 위 네 요소가 충족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낀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차가 공정하면 법과 제도를 지지한다. 우리 법정이 이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 판결문보다 판사의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재판의 공정성은 법조문이 아니라 판사의 언어와 태도에서 드러난다. 판결문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당사자가 법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신뢰는 무너진다. 판사의 시선, 말투, 표정, 호칭까지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사법의 품격은 법률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청과 절제, 인간적 배려의 표현력이 신뢰의 토대가 된다.
◆ 공정함은 심리적 경험이다
법정에서의 공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가 체험하는 정의다. 자신의 이야기를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말할 수 있었는지, 판사의 반응이 일관되고 공정했는지,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법은 공정하다”는 사회적 감정을 형성한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제도의 개편을 넘어 공정이 체감되는 재판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판사는 ‘옳은 결론’을 내리는 기술자이기 이전에, ‘공정한 과정을 설계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 맺음말 ― 정의는 마음속의 신뢰에서 자란다
사법 신뢰는 법조문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감 위에 세워진다. 국민이 법정을 나서며 “결과는 아쉽지만 절차는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이미 성숙한 법치국가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회 전자청원 탄핵 동의’가 단기간에 5만 명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국민이 사법부에 요구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대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판결 이전에 절차의 공정성과 소통의 투명성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공정은 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만들어내는 정의의 심리학이기 때문이다.